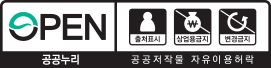역사·생태
봉은사
봉은사(奉恩寺)는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수도산(修道山)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에 속한 서울의 대표적 사찰이다.
이 사찰의 창건 시기는 그동안 1932년에 권상로(權相老)가 지은 <봉은사사적비명(奉恩寺史蹟碑銘)>에 의해 통일신라 원성왕 10년(794)에 연회국사(緣會國師)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있는 봉은사와 현재의 봉은사를 동일한 사찰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봉은사는 경주 지역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의 봉은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봉은사의 원래 명칭은 견성사(見性寺)였다. 따라서 이 사찰의 연혁은 견성사로부터 확인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고려시대에 봉은사의 전신(前身)인 견성사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견성사는 본래는 현 위치에서 서남쪽으로 1km 쯤 떨어진 선릉(宣陵)의 동쪽에 있었다. 연산군 4년(1498)에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선릉의 원찰(願刹)로 견성사를 중창(重創)하고 봉은사라 사찰명을 바꾸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절의 실질적인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봉은사가 명실상부하게 조선 최대의 명찰(名刹)이 된 것은 명종 3년(1548)에 보우대사(普雨大師)가 주지로 부임한 이래, 당시 섭정(攝政)을 맡고 있던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적극적인 옹호를 배경으로 하면서부터이다. 즉 명종 6년에는 보우대사가 판사(判事)가 되어 부활된 선종(禪宗)의 승과(僧科)를 보게 하면서 봉은사를 선종수사(禪宗首寺)로 지정하였다. 명종 7년(1552)에는 봉은사 맞은편에 있는 지금의 삼성동 무역센터와 한국종합전시관 자리에서 선종 승과고시가 대규모로 치루어져 이 뒤부터 이 곳을 '중의 벌' 또 는 '승과평(僧科坪)'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어 명종 17년(1562)에 보우대사가 지금의 위치인 수도산으로 절을 옮겨 세웠다. 보우대사 이후 봉은사에서는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과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惟政) 등 덕 높은 승려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그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대전란 때 불타버린 것을 인조 15년(1637)에 중건하였고, 영조 33년(1757)에는 조정의 하사금을 받아 절을 중수하였다. 정조 14년(1790)에는 전국 사찰의 승풍(僧風)과 규율을 감독하는 5규정소(五糾正所)의 하나가 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찰 일부를 관할하게 되었고, 순조 24년(1824)에 다시 한번 중수하였다. 철종 6년(1855)에는 화엄경을 판각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경판(經板)을 완성하였고 판전(板殿)을 지어 안치하였다.
1911년에 제정 공포된 <사찰령(寺刹令)>에 의한 30본사(本寺) 중 갑찰(甲刹) 대본사(大本寺)가 되어 서울과 경기 일원의 80여 사찰을 관장하게 되었다. 1925년 을축년(乙丑年) 대홍수 때는 한강이 범람하여 인근 주민 1천여명이 강물에 빠지자, 나청호화상(羅晴湖和尙)이 중심이 되어 708명을 구제하였는데, 이를 기리는 시와 글·그림을 모아 《불괴비첩(不壞碑帖)》을 편찬하기도 하였고, 1929년에 도움을 받은 주민들이 절 앞에 수해구제공적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후 1939년에 불탄 것을 1941년에 다시 중건하였다.
광복 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직할사찰이 되었다. 1972년에는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의 역장(譯場)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한글화하는 역경사(譯經士)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대웅전은 정면 3칸의 건물이었던 것을 1982년에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중창하였는데, 팔작지붕이며 그 현판 글씨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필체이다. 이 대웅전 안에는 범종(梵鍾) 2구가 놓여 있는데, 조선시대 범종을 대표할 만한 우수한 작품이다.
판전(板殿)은 봉은사가 소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4호 《화엄경소(華嚴經疏)》를 비롯한 총 15종 1,480매의 많은 경전(經典) 목판본(木板本)을 보관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각이다. 이 판전은 철종 6년(1855)에 건립되어 현재 봉은사에 남아 있는 전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식(翼工式) 맞배지붕으로 세워졌다. 정면 처마의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71세 때 병중에 쓴 글씨로 알려져 있다. 판전 아래쪽에 있는 비각(碑閣)은 고종 7년(1870)에 세워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보호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 비각의 오른쪽에는 1986년에 세운 추사김정희선생기적비(秋史金正喜先生紀績碑)가 자리하고 있다.
선불당(選佛堂)은 대웅전 한단 아래 왼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중을 위한 일종의 선방(禪房)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건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정면 8칸 측면 3칸의 단층 목조 기와집으로 초익공(初翼工) 양식을 이루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나 전·후·좌·우 네 곳에 작은 합각(合閣)을 형성하였다. 이 전각은 비록 연대가 오래지 않고 다소 변형되었으나 서울 시내에 이만한 크기의 거창한 선불당은 그 유례가 없으며, 19세기의 귀중한 목조건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미타사
동빙고(東氷庫)가 있던 달맞이봉 서쪽 기슭 옥수동 395번지에 두뭇개 승방인 미타사(彌陀寺)가 있다. 오늘날 미타사는 888년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1943년에 편찬된 ≪종남산미타사약지(終南山彌陀寺略誌)≫에 의하면 19세기 초반에 이곳에 무량수전을 처음 지은 사실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와는 달리 미타사는 고려말 조선초부터 종남산 동쪽 기슭 현 금호동에 있었는데, 이 부근에 있던 왕실 경영의 메주가마를 자하문 밖으로 옮김에 따라 이곳에 도적이 들끓었으므로 지금의 자리로 절을 옮겨 종남산 미타사로 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곳에는 신라·고려 이래로 조그만 암자들이 있었는데 절 뒤의 산봉우리가 100명의 과부가 나타날 상이라는 풍수설에 따라 비구니 사찰을 확장할 적절한 곳이라 여기고 조선 중기에 암자들을 합쳐 미타사라 했다고도 한다. 여기서 종남산은 남산 줄기의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절에는 이승만전대통령이 자주 다녔다고 한다.
약사사(개화사)
약사사(藥師寺)는 고려 말기에 창건된 사찰로 강서구 개화동 32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경내에 있는 3층석탑과 석불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약사사는 행주산성이 마주 보이는 곳에 동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지어졌다. 이 절이 위치하고 있는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는 동쪽은 서울 목멱산(남산) 제5봉, 서쪽은 김포현 북성산과 연락되며, 약사사의 위치를 개화산 봉수대 아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방과도 관련된 곳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약사사 3층석탑은 고려 말기인 13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탑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높이는 4m이다. 탑의 맨 꼭대기를 장식하는 구조물인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 탑이다. 탑을 지탱하고 있는 제일 아래 부분인 기단부는 한 장의 넓적한 널돌로 된 지대석(地臺石) 위에 네 개의 각기 다른 돌을 돌려서 맞추어 놓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 바로 위에 놓여 있는 탑신석의 돌 네 모퉁이에는 기둥 모양의 우주(隅柱)가 조각되어 있다. 목조 건축물의 지붕과 같은 옥개석은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고, 옥개석 아래 부분에 새겨진 층급 받침은 5단∼6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탑은 고려 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려 중기 이후의 탑파 건축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약사사 석불은 머리에 둥근 돌갓을 쓰고 서 있는 보살상이다. 이 석불입상은 모양새가 관음보살상으로 보여지며, 예로부터 이 돌부처가 들어 앉았던 집을 미륵당이라 하였듯이 미륵불로도 불리고 있다. 이 불상이 위치한 절이 약사암(藥師庵)으로 불려왔으나 이것만으로 이 불상을 약사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발견 당시에는 현재의 약사전 바로 옆의 미륵당 건물 속에 있었다. 아래 쪽 일부가 땅 속에 묻힌 채 세워 져 있던 것을 1974년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함께 원래의 위치에서 3m 가량 앞으로 이동되어 완전히 노출된 채 새로이 불상 아래 부분에 넓은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올려 놓았다. 머리 위에 얹혀 있는 돌갓 밑 부분에는 수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 특히 주목을 끌고 있으나 판독할 수가 없다. 연대는 대체로 약사사 3층석탑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고려 말기로 추정되며, 이런 유형의 석불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준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발간, 2001.10.)』 수록내용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총괄부 - 한강문화관광과
- 문의 :
- 02-3780-0763
- 수정일 :
- 2023-02-23
- 등록일 :
- 2022-12-1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