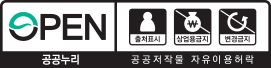역사·생태
풍납리토성
풍납리토성(風納里土城)은 송파구 풍납동 72-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6,701평(121,325㎡)으로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풍납리토성은 백제 초기의 성지 가운데 가장 장대한 규모를 가진 성이다. 서북쪽으로 한강에 직면하고 있고, 강 맞은 편에는 아차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남쪽으로 성내천을 사이에 두고 2.5km 거리에 몽촌토성이 있으며, 동쪽으로 이성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 성은 한강변에 위치한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비정되고 있다. 광주 풍납리토성이란 이름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할 당시 이곳이 경기도 광주군 풍납리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딴 것이다.
또한 이 성은 사성(蛇城, 배암드리)으로 비정되어 왔는데, 사성은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차성(阿且城)과 함께 쌓은 성이다. 사성은 언어학적으로 '배암드리'로서 그것이 오늘날 발음인 '바람드리'(風納)로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토성의 자취를 인정할 수 있는 주위는 2,679m 밖에 안되지만, 원래의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타원형을 이루었으며, 주위는 약 4km, 남북 2km, 동서 1km에 이르렀으나, 한강 쪽의 서벽은 1925년의 큰 홍수로 유실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3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동벽은 거의 같은 간격으로 네군데가 외부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축성 당시부터의 문 터로 보고 있다.
비교적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북벽의 경우 정상에서 약 2m 내려간 위치에서 1단의 넓은 단을 만들었고 거기서부터는 경사를 줄여서 폭 30m 가량의 기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성벽과 성 내의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백제 초기의 왕성 즉 하남위례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온조가 '하남의 땅이 북으로 한수(漢水)를 끼고 동으로 고악(高岳)에 거하고 남으로 옥택(沃澤)을 바라보고 서쪽은 대해(大海)로 가로막혔으니 그 천험(天險)의 지리를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하남위례성의 대상지로서 풍납리토성이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다.
특히 1999년 풍납리토성 동쪽 벽을 일부 절단하여 조사한 결과 이 토성이 폭 40m,높이 9∼15m에 이르는 거대한 판축(板築) 토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나온 나무·목탄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토성이 기원전 2세기∼기원후 2세기에 만들어진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후 토성 안 지표 밑 4m에서 여(呂)자형의 집터, 말머리뼈, '대부(大夫)'라고 쓰인 토기, 기와, 주춧돌 등 대형 건물에 쓰였을 재료 등 유물과 유적이 잇따라 발굴됨에 따라 '풍납리토성=위례성'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한편 풍납리토성의 축조 방법을 보면 본래 몸체를 흙으로 쌓은 토성이지만, 단면을 보면 돌은 거의 없고 고운 모래 뿐인데 그것을 엷은 층으로 한 층 한 층 다져 쌓아서 올라간 것이다. 특히 동벽의 절단 조사 결과 이런 규모의 성곽 축조에 필요한 인력이 수 십만∼수 백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한 시기도 기존의 기원후 3세기에서 최대 400년까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 초기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토성의 성격 규명은 백제사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고, 2000년 5월 문화재위원회에서 풍납리토성 내 경당연립 재건축부지를 사적으로 지정·보존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정부에서는 풍납리토성 안의 사유지를 점차 매입하여 정비·복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몽촌토성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몽촌토성(夢村土城)은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서 한성시대 백제 도성의 유력한 후보지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적 제297호로 지정되어 있다. 1983년부터 성의 규모와 축조 방법·내부 시설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 조사가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 1983년에는 성의 규모 파악을 위한 외곽 발굴이 실시되었고, 1984년에는 서울대·숭실대·한양대·단국대에 의해 4구역으로 나뉘어 성의 축조 방법과 내부 시설물의 확인을 위한 부분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5년에 전반적인 유구 분포상황 조사와 3개 문 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행해졌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서울지역 백제고도 민족문화유적 복원계획>에 따라 1985년까지의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몽촌토성을 현상유지 수준에서 복원·정비하였다. 그후에도 몽촌토성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계속되어, 1987년과 1988년에 토성의 동남지역이 발굴되었다.
몽촌토성은 한강 남안 성내천(城內川)을 끼고 있는 구릉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토성이 자리잡고 있는 구릉은 표고 40∼45m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려 전체적으로 서고동저(西高東低)·북고남저(北高南低)의 지세를 이루며 거의 중앙에서 서-동·북-남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전체를 4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 밖은 청량산 남한산성에서 발원하여 동에서 북으로 흘러드는 성내천이 휘감고 있어 자연적으로 참호(塹壕)를 이루고 있는데, 1986년 성이 복원·정비되면서 성 주위에 해자(垓字)가 만들어졌다.
성의 외벽은 구릉 경사면을 깎아내어 급경사와 단을 만들고 두 번째 단에는 목책(木柵)을 설치하였다. 현재 목책은 본성의 서북벽·동벽과 외성 등 3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생토암반층에 큰 나무를 박아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조기둥을 세웠다. 목책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목책은 발굴 조사된 원래의 목책 기둥 자리를 따라 그 위에 추정 복원한 것이다.
토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자연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적인 윤곽은 남북으로 길쭉한 마름모 형태에 가깝다. 토성의 크기는 남북 최장이 730m 정도, 동서 최장이 540m 정도이며, 전체 성벽의 길이는 정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약 2,285m에 달하고, 따로 동북벽에서 270m쯤 뻗어나간 곳에 외성이 있다. 토성 내의 면적은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약 21만 6천㎡(64,000평)에 해당하나, 외벽 하단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넓어진다.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11∼38m에 해당하는데 축조 당시에는 지금보다 3∼4m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벽의 네 모서리에는 주변보다 3∼5m 정도 더 높은 토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망루와 연락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3∼1987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 조사 결과 거주지 8기, 저장공 22기, 토광묘 2기, 옹관묘 5기, 토광적석묘 5기 등 총 4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1988년의 발굴에서는 백제시대의 거주지 5기, 저장공 7기, 생활면 유구 1개소, 방형 수혈 유구 1개소, 적석 유구 3개소와 조선시대의 움집터 3곳과 지장건물지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의 축조 시기는 출토 유물 중 확실한 연대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빠른 것이 서진(西晋, 265∼316)시대의 회유전문도기편(灰釉錢文陶器片)으로서 3세기 말까지 올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진 도기 출토 층 밑에서 보다 앞선 백제 유물층이 확인되었기에 그 축조연대는 더 이를 것이다. 또 이 성이 단시간에 걸쳐 일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의 축조 시기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성의 사용 시기는 성내 주거지나 저장고에서 육조(六朝)시대의 청자편 도자기류와 4∼5세기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보면 4∼5세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 내부나 성벽 위에 축조된 토광묘·옹관묘·토광적석묘 등은 몽초토성의 폐기 후에 만들어진 5세기 중반 이후의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몽촌토성은 늦어도 3세기 말에 축조되어 5세기 중엽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또 그 지리적 위치와 규모·축조방법, 목책 등이나 수많은 철촉·골제찰갑·와당·벼루 등을 고려하면 정치·군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성(居城) 수성(守城)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배세력 집단이 거주하였을 와가(瓦家) 구조는 나오지 않았으나, 고식의 와당이나 기와편 그리고 중국제로 보이는 벼루 등의 출토로 미루어 지배층의 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의 존재를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몽촌토성 안(송파구 방이동 88-4)에는 화강암으로 된 충헌김공신도비(忠憲金公神道碑)가 위치해 있다. 198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었으며, 규모는 전체 높이 4.06m, 비신의 높이 2.74m, 폭 1.02m이다. 이 비는 조선 숙종 때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으로 우의정을 역임한 김구(金構, 1649∼1704)의 신도비(神道碑)로서, 영조 19년(1743)에 건립되었다. 비의 북쪽에 있는 그의 무덤은 18세기 전반기의 묘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몽촌토성의 북쪽 기슭에는 1992년 몽촌역사관이 건립되어 한강 유역을 포함한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암사동·명일동·역삼동의 선사시대 주거지와 가락동·방이동·석촌동의 고분군, 몽촌토성의 유적 모형과 출토 유물을 전시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차산성과 장한성
광진구 광장동 산 16-46번지와 구의동 산 1-2번지에 걸쳐 있는 아차산성(阿且山城)은 아단성(阿旦城)·아차성(阿且城, 峨嵯城)·양진성(楊津城)·광진성(廣津城) 등으로 불리운다. 1973년 사적 제234호로 지정되었다.
아차산성은 <광개토왕비문>의 영락 6년조에 광개토왕이 백제로부터 공취한 58성 가운데 아단성의 이름이 보이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이끈 군대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킴에 따라 개로왕이 생포되어 아단성 아래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아단성은 고구려 군대가 주둔한 군사진지였으며, 그 뒤 77년간 한강 유역을 통치한 고구려의 전방기지로서 기능하였다.
또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아차산에는 양진성과 아차산고성이라는 2개의 성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진성은 나루를 방비하기 위한 성곽으로 현존하는 유구나 문헌자료를 통해 볼 때 아차산의 지봉인 광나루 북방 약 100m 높이의 동남면에 위치한 광진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아차산고성은 《대동여지도》에 보이는 망우리 쪽 아차산에 소재하고 있는 성곽을 아차산고성의 유지로 보고 있다.
아차산성은 석축성으로 기본형태는 테뫼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산 정상부를 돌아가며 축성한 테뫼식과는 달리 아차산 능선 말단부의 남쪽 지역을 적절히 이용하여 작은 계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 내에 우물과 작은 계곡이 흐르는 포곡형 산성에 가까운 형태이다. 성곽은 아차산 남쪽 봉우리의 해발 205.5m 지점을 북쪽 장대지로 하여 등고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산성 전체의 축성 형태는 약간 길쭉한 부정형의 6각형이며 전체 길이는 1,125m, 내부 면적은 약 25,000평(133,700㎡) 정도이다. 정상부 장대지에서는 서울 시내 전역과 한강변 일대 풍납리토성·몽촌토성·이성산성·남한산성·북한산성·암사동 선사유적 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지 내에서 7개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었다.
한편 장한성의 유구는 본래 뚝도 부근의 한강변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고지를 따라 아차산에 이르고 다시 망우리에 이르는 산줄기를 따라 용마봉에 못 미치는 벼랑바위산에 이르기까지 산마루를 따라 석성 터가 있으며, 구리시 아천동까지 그 유구가 나타난다. 이를 장성 또는 장한성이라 하는 데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 고적조에 '장한성이 한강 위에 있는데 신라 때 여기에 중요한 진영을 두었으며 고구려에 의해 점령당하였다가 군사를 동원하여 수복하고, 장한성가(長漢城歌)를 지어 그 공을 기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은 산 정상이나 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성이나 석성이 아니고 산 정상을 지나 등선을 따라 일직선 형태로 축조된 성벽으로 하남시 춘궁리에 있는 이성산성과 축성양식이 같은 신라시대의 산성으로 특히 삼국통일 전쟁 수행을 위한 북진기지 가운데서도 군사적 요충으로 추정된다.
이 장한성의 유구는 조선시대 목마장의 담장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일찍이 제기되었다. 즉 지금의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는 둘레 20km에 이르는 살곶이목장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 목장의 담장은 아차산 능선에서 확인되는 장한성 성벽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선고적조사보고》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 등의 살곶이목장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면서 목마장 담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아차산 줄기를 따라 양쪽 평야지대로 뻗은 곳인 중곡동 쪽 중랑천 방향과 그 반대편인 광장동 쪽 아차산 지봉에는 방위 목적을 가진 수많은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장경호와 같은 고구려 토기가 보루나 보루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유구는 목장이나 사냥과 관련된 부속시설이 아니라 최소한 고구려 군대 주둔처로 인정된다. 확인된 보루는 1970년대 후반에 발굴된 구의동 유적지인 현재의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부터 광장동으로 하여 아차산으로 올라가 정상을 통과하여 나가다가 북서편으로 휘어지면서 건너편 배봉산까지 이어진다. 또 한 줄기의 보루는 중곡동 대원고등학교 쪽에서 동북편으로 올라가 용마봉을 통과하여 아차산 정상에서 구리시 아천동과 교문동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두 열의 보루는 아차산 정상 부근에서 교차한다.
따라서 보루의 연결선상과 관련하여 아차산 장한성의 존재가 주목된다. 아차산 장한성은 입지조건으로 볼 때 서쪽의 뚝섬 방향에서 침입해 오는 적에 대비하여 도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차산성 일원의 방위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즉 아차산 보루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길게 축조된 장한성은 한강 하구를 비롯한 서북방향이 주 방어대상인 아차산 일원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시켜 도성의 외곽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행주산성
행주산성(幸州山城)은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산 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둘레가 약 1km, 면적은 48,570평이며, 사적 제56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행주(幸州)는 한양(漢陽)의 외곽지대로 한강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중요시되었던 곳이다. 행주산성이 위치한 덕양산(德陽山)은 삼국시대부터 토축(土築) 산성이 있었다. 산성은 해발 124.8m의 덕양산의 해발 70∼100m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테뫼식(山頂式) 산성으로, 남쪽은 한강이 연하여 있고, 동남쪽으로는 창릉천(昌陵川)이 산성을 돌아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어 자연적인 해자(垓字)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성의 동남쪽과 남쪽 일대는 자연 경사가 매우 급하여 자연적인 요새로서의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산성의 동북방 일대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덕양산 정상에 올라서면 한강 이남 일대는 물론 멀리 북쪽으로는 고양시(高陽市) 일대가 한눈에 보이며, 사방으로 시야가 막힘이 없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행주산성은 이러한 자연지세를 이용한 천연의 요새지로서, 강안의 돌출된 산봉우리를 택하여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內城)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外城)의 이중구조를 하고 있다. 강안의 험한 절벽을 이용하고 동·북·서로 전개된 넓은 평야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 형식과 부합된다.
현재 성벽은 내성의 경우 정상부를 깎아 내어 다듬은 뒤에 둘레 약 250m의 토루(土壘)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상에서 동북쪽 산등성이를 따라 외성의 자취가 남아 있는데, 이 외성은 자연 능선을 이용하여 양쪽에서 석심을 두고 판축(板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곡 쪽의 성벽은 유구(遺構)를 찾을 수 없으나 산 중복을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중식 산성은 삼국시대의 새로운 형식으로서 주목된다. 성 내에서는 삼국시대의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어골문(魚骨文)·수지문(手指文)의 기와편도 발견되고 있어 고려시대까지도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幸州大捷)이 있었던 지역으로 권율(權慄) 장군이 왜군을 맞아 크게 이긴 곳이다. 권율은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로서 관군과 명나라 군사가 평양을 수복하고 남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호응하여 서울을 수복하기 위하여 관군을 이끌고 북으로 올라와 수원(水原) 독산성(禿山城)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어 권율은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서울 주변인 안현(鞍峴)에 진을 치고자 하였으나, 막하 장수들의 의견에 따라 행주산성을 진지로 삼았다.
권율은 행주산성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은밀히 군사를 이곳으로 옮겨 진을 쳤는데, 이 때 산성에 포진한 총병력은 군인과 일반 백성을 합하여도 1만명이 채 못되었다. 이후 권율이 정예병을 뽑아 서울에 보내 전투태세를 갖추자, 왜군은 총대장 우키타(宇喜多秀家)를 비롯하여 본진의 장수들까지 7개 대로 나누어 행주산성으로 진군하니 전 병력은 3만여명이었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일본군이 총동원되어 행주산성을 포위하고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가면서 공격해왔다.
그러나 성 안의 조선군은 산세를 이용하여 화살·창·칼 외에 변이중(邊以中)이 만든 화차(火車), 권율의 지시로 만든 수차석포(水車石砲)라는 특수한 무기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 때 위기상황으로 동요하기도 하였으나, 권율의 독전(督戰)으로 이를 극복하고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치열한 싸움에서 조선군이 크게 이겼다. 일본군은 총대장 우키타가 부상을 입고 퇴진하였고, 전사자의 시체 무더기를 사방에서 불태우고 도망갈 정도였다. 이 때 부녀자들까지 동원되어 관민(官民)이 일치단결하여 싸웠으며, 특히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서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행주대첩으로 인하여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가 사기를 회복하고 일어나 점차 적을 남으로 쫓고 정부가 환도(還都)하게 되었으니 그 의의는 실로 크다 하겠다.
그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선조 36년(1603)에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를 세우고, 헌종 때에 기공사(紀功祠)를 세웠으며, 1963년에는 덕양산정에 새로 대첩비가 건립되었다. 1970년에는 행주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정화작업을 벌여 권율을 모시는 충장사(忠莊祠)를 세우고 정자와 문도 세웠으며,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경역(境域)을 규모 있게 조성하면서, 1845년에 옛 비의 내용을 새로 새겨 세운 행주 기공사 경내의 대첩비를 충장사 옆에 옮겼다. 또한 그 중수기념비(重修記念碑)를 덕양정(德陽亭) 건너편에 세웠다.
1990년 12월에는 고양군에서 산성 동북방에 남아 있는 토성지(土城址)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굴조사(試掘調査)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행주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였음이 확인되었는데, 출토 유물로 보아 7∼8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암산성
호암산성(虎巖山城)은 금천구 시흥2동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상으로 서울의 남서쪽에 해당된다. 이 곳의 산성 터와 한우물이라 하는 연지 등은 사적 제34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89년 10월과 1990년 3월의 두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해발 347m의 조그만 봉우리를 최고봉으로 하는 산 정상의 성 내부는 비교적 평탄지형을 이루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2km 지점에 해발 629m의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가 위치하고, 동남방 1km 지점에 해발 460m의 삼성산 정상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 동북방에 연접하여 이 삼성산의 지봉으로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을 한 호암산이 보이며, 마을에서는 이를 '범뫼'라고 부른다. 산성의 입지조건으로 볼 때 호암산성은 안양 금천 일대의 평야를 관할하는 요새지로서 서쪽의 해안과 북쪽으로 침입하는 적에 대한 공격과 방비를 위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암산성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길쭉한 마름모꼴인데 성벽의 총 연장은 약 1.25km이고 성벽은 표고 325m의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테뫼식 산성이다. 현재 산성 터 내부에서 확인된 유구는 우물 터 2개소와 건물 터 4개소이다.
발굴된 제1우물지(기존의 한우물)는 최근까지 조선시대에 쌓아 올린 석축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석축지가 확인되었다. 연못지의 내부 퇴적토에서 백자편을 비롯한 조선시대 유물과 7∼8세기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제2우물지에서는 '仍伐內力只乃末'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산성이 위치한 금천 일대는 백제의 영역이었을 때의 지명은 기록이 없으며,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 잉벌노현(仍伐奴縣)이 되었다.
이후 신라 경덕왕 때 잉벌노현이 곡양현으로 바뀌었고, 경덕왕 16년(757)에 잉벌노현이 속해 있던 한산주가 한주로 개칭되고 그 영현으로 1소경과 27군 46현의 군현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때에 이르러 종래의 토착 지명이 한자풍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호암산성 내의 우물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해 볼 때 산성 축성의 하한선이 경덕왕 16년이 된다.
그런데 호암산성의 입지조건으로 볼 때 문무왕 12년(672)의 '한산주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주장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일장산성 즉 신라 때 주장성은 문무왕이 쌓았다.'라고 기록된 오늘날의 남한산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호암산성은 신라와 당나라간의 전쟁이 임진강과 한강을 경계로 하여 전개될 때 광주의 주장성과 남양만의 해안지대를 이어주는 교량적 요충지를 만들기 위해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산성 내 축조된 제1우물지의 석축 구조가 문무왕 14년에 만들어진 경주 안압지의 석축 구조와 거의 유사하여, 산성의 축조시기가 문무왕대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한 관방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석축 구조는 현재 축조 당시의 원형이 남아 있는 남동 모서리의 경우 모두 13단으로 쌓여져 있고 석축의 제일 아래 단은 약 20cm 가량 앞으로 내어 쌓고 위로 가면서 들여 쌓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안압지의 축조 수법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출토된 유물·유적과 지리적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문헌기록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호암산성의 축성시기는 문무왕 12년경으로 보고 있다.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 때 한강을 넘어 수원 지역으로 내려가는 육로와 남양만으로 침입하는 해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 공격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지였다고 하겠다.
또한 호암산성 발굴에서 통일신라시대 이외에 고려시대의 유물도 많이 출토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한성 수복을 위해 행주산성과 연합한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 장군이 인솔하는 조선 군사들이 주둔한 곳이기도 하다.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발간, 2001.10.)』 수록내용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총괄부 - 한강문화관광과
- 문의 :
- 02-3780-0763
- 수정일 :
- 2023-02-23
- 등록일 :
- 2022-12-1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