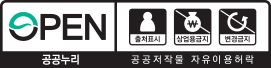역사·생태
밤섬의 역사
밤섬의 역사
마포 앞에는 밤섬(율도)과 여의도가 있다. 조선시대 밤섬과 여의도는 하나의 섬이었다. 마포 와우산에서 굽어 본 모습이 마치 밤알을 닮았다 해서 밤섬이라 이름 붙여졌다. 길고 깨끗한 은빛 모래밭과 그 주위로 펼쳐진 버드나무 숲,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의 깨끗한 강물은 오랫동안 마포 8경의 하나로 꼽혔다.
고려 초기에는 귀양지였던 밤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 한양천도 때로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처음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밤섬에는 조선소가 있어 부유한 조선업자들이 거주하였고 약초나 채소 등 사업적 농업이 번성하였다. 특히 밤섬은 뽕나무로 유명하였다. 또한 겨울철에는 채빙(얼어붙은 강바닥, 빙벽 따위에서 얼음을 자르거나 쳐서 필요한 만큼 얻어 냄)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주민들은 뽕나무와 양초(감초)를 심고, 염소를 방목하며 살았으며 1967년까지 주로 조선, 도선업, 어업과 땅콩, 채소농사 등을 생업으로 했다.
해방 후 밤섬의 행정구역 명칭은 마포구 율도동. 폭파후에는 아랫밤섬과 윗밤섬으로 갈라져 아랫밤섬은 마포구, 윗밤섬은 영등포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폭파 후 10여개의 조그만 섬의 형태로 남아 있던 밤섬은 해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 등이 쌓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당시에는 241,313㎡에 달할만큼 면적이 넓어졌다. 그러나 1968년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곳의 흙이 여의도 윤중제 공사 등에 모두 투입되었고 당시 주로 조선(造船)·어로(漁撈) 등의 직업에 종사하던 62가구 433명의 주민들은 섬을 떠나 마포구 창전동으로 이주되었다.
밤섬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사라졌던 밤섬에서 갈대가 자라고 버드나무가 싹을 틔우면서 물새들이 돌아온 1986년 한강관리사업소가 생겨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철새도래지로 인정받아 1988년에는 갈대, 갯버들, 버들강아지, 찔레 등 5만 8000포기의 식물을 심기도 했다. 서울시는 99년 밤섬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밤섬의 철새가 다시 돌아오는 등 자연적 생태 복원의 의미는
첫째, 한강생태계의 바로미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둘째, 밤섬의 재등장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밤섬의 생태
밤섬은 1999년 서울시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국제 협약에 근거해 희귀 동식물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로 공식 지정되었다.
밤섬에는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해오라기, 청둥오리, 희뺨검둥오리, 꿩, 멧비둘기, 뻐꾸기, 제비, 쇄개개비, 찌르레기 등이 서식한다. 또한, 해마다 찾아오는 흰꼬리수리, 원앙, 황조롱이, 참매, 말똥가리 등의 철새뿐만 아니라 5월이면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과 여름 철새인 개개비, 해오라기 등 많은 새의 짝짓기와 산란 장소로 장관을 이룬다. (출처 : 마포구, 『마포이야기』, 마포구 문화관광과, 2014)
고향을 잃어버린, 밤섬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
고향을 잃은 지도 벌써 50년이 다 됐네. 이젠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이북 출신이냐고? 아니야. 내 고향은 서강대교 아래 저 건너편에 있는 밤섬이란 곳이야. 지금은 철새들의 낙원이 됐지만 50년 전만 해도 60가구가 넘게 살던 아름다운 섬마을이었다고.
생긴 게 밤톨 같다고 해서 율도(栗島)라고도 하고 밤섬이라고도 했어. 밤섬을 둘러싸고 넓게 펼쳐진 은빛 백사장은 명사십리 뺨치게 고왔단 말이야. 마포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절경이었어. 게다가 물은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였어. 그 물로 밥도 짓고 국도 끓여 먹고 살았지.
예로부터 밤섬은 배 짓는 마을이라고 불렸어.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면 밤섬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니까. 우리 집만 해도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까지 경강에서 알아주는 배 목수였으니까. 아버지와 동네 아제들이 그 너른 백사장에서 배를 만드는 동안 나는 친구들하고 멱을 감으며 놀았는데, 일하다 더우면 어른들도 풍덩 강물에 뛰어들어 난데없는 수영시합을 벌이기도 했다고. 참 좋은 시절이었지.
밤섬은 외지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온 동네 꼬마들까지 모두 그 이름을 알만큼 한가족같이 지냈어. 전기도 없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남부러울 게 없었지. 그래서 남폿불에 강물 떠먹으며 살았지만 탈 나는 사람이 없었고 매일같이 배를 타도 사고가 안 났어. 우린 그게 다 부군 할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전쟁의 포화로 마을이 풍비박산이 났을 때도 부군당집 만은 멀쩡히 살아남아 우리가 재기할 힘을 주셨지. 그런데 그런 부군 할아버지도 개발 열풍을 당하지는 못하셨던가 봐.
“콰과광!!”
1968년 2월 10일 오후 3시. 몸서리치는 굉음과 함께 내 고향 밤섬이 사라졌어. 여의도 개발에 필요한 잡석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의도 개발이 한강의 기적이었는지 몰라도 우리에겐 비극이었지. 하루아침에 고향에서 쫓겨나는 마당에도 마을 사람들의 조건은 단 하나였어. 멀리서나마 밤섬이 보이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지. 나중에 개발계획이 있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린 다 필요 없었어. 결국, 밤섬을 굽어보는 와우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수백 년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이 폭파되는 걸 보며 목놓아 통곡했지.
우애 깊던 밤섬 사람들은 곧 아파트 개발 때문에 이주한 곳에서도 밀려나 뿔뿔이 흩어졌지. 그렇게 밤섬은 잊히고 마는가 싶었어. 그런데 말이야, 자연은 밤섬을 잊지 않았던 거야. 한강이 모래와 흙을 실어와 사라졌던 밤섬을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동식물이 찾아와서 섬을 되살린 거야. 지금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 섬에 겨울이면 철새들이 몰려와 장관을 이룬다고. 이제는 생태섬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게 내 낙이지.
자, 거기 망원경으로 한번 들여다봐. 그곳이 바로,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내 고향 밤섬이야.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한강사(漢江史)> 724~726쪽, 1985
- 이경재, <서울 정도 육백년> 283~284쪽 , 서울신문사, 1993
- 최래옥 편저, <옛날 옛적 서울에> 248~250쪽, 서울학연구소, 1994
- 윤진영 외 7명, <한강의 섬> 180~201쪽, 마티, 2009
- 유덕문 밤섬보존회장 인터뷰, 2014년 7월 5일
-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의 젖줄 한강』, 국립민속박물관, 2000
- “이일용님의 구술생애사”, <20세기 민중생활사>, 2010년 4월 18일,
- “밤섬의 '마지막 배 목수들' 고향 찾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20일
- “밤섬 실향민을 만나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 11월 20일
- 이전글
- 다음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